
공유지의 비극!
환경이나 생태를 이야기하면 꼭 등장하는 이야기다. 공동 목초지에서 함께 소를 방목해 키우다보면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저마다 한 마리 한 마리 소를 늘리다 결국 목초지는 고갈되고 만다는 것이다. 공유된 자원은 이렇듯 인간의 이기심으로 훼손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러나 정말 그럴까?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은 공유지가 훌륭하게 관리되어 전승되고 있는 전세계 많은 사례를 조사하였고 이를 규칙화하였다. 가장 큰 원칙은 공동체안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떨 때는 전승되는 터부나 미신으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계약으로 있기도 하다. 공유지의 비극이 이 사회를 설명하는 중심이론이었다면, 아마도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의 이야기를 빌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동의 어장을, 공동의 뒷산을, 공동의 마을 우물을 수천년 동안 관리해온 우리 조상들의 경험도 이미 알고 있다.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경제문제를 이야기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을 떠올린다. 서로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생겨서 결국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은 실제 시장은 독점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경쟁구조를 갖고 있고 정보도 불완전하며 가격으로만 다수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도 있고 소득과 자산이 불평등한 것 등의 이유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한계를 알면서도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 시도에 대해서도 사회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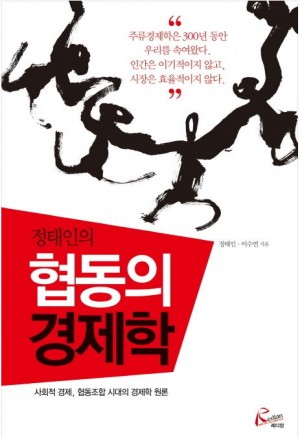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경제의 근거가 되었다면 정태인 선생님은 ‘상호적 인간’을 근거로 협동의 경제학에 대해 설명하셨다. 상호적인 인간은 선한 인간과는 다르다. 협동경제는 선한 인간만 있어서도 안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는 인간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양의 상호성도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음의 상호성도 있어야 가능한다. 착한 사람이 손해만 보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다는 것을 떠올리는 대목이다. 실제로 서로 믿는 사회에선 분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경제의 근거가 되었다면 정태인 선생님은 ‘상호적 인간’을 근거로 협동의 경제학에 대해 설명하셨다. 상호적인 인간은 선한 인간과는 다르다. 협동경제는 선한 인간만 있어서도 안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는 인간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양의 상호성도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음의 상호성도 있어야 가능한다. 착한 사람이 손해만 보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다는 것을 떠올리는 대목이다. 실제로 서로 믿는 사회에선 분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경제적일 수밖에 없다.
협동경제는 바로 사회적 경제이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에 의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이미 그 사례는 세계적으론 스페인에서 매출 7위의 기업으로 성장해 85,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의 퀘벡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생협 한살림과 아이쿱의 조합원 가구 수는 전체 1800만 가구의 약 3%가 넘는 60만 가구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로 빚어지는 숱한 문제점들의 답이 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실마리는 되지 않을까? 더구나 그것이 사람들을 극한의 경쟁으로 밀어넣는 구조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회로 가는 바탕이 된다면? 생각만 하도 기분 좋은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