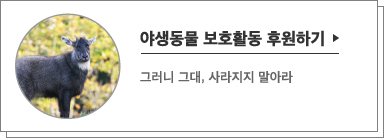평소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도보여행을 하던 중 생전 처음으로 도로에서 죽어간 고라니의 눈동자를 보며 로드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고라니를 보지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본 고라니는 온 몸이 부서지고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터져나와 처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지 못한 눈동자에는 수많은 메세지가 담겨있었습니다.
고라니가 저에게 더 이상 이런 헛된 죽음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로 위에 온전히 누워있지만 숨이 멎었거나, 수많은 자동차들이 밟고 지나가 엉망이 되어버린 주검 앞에서 로드킬이 정말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상, 로드킬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했습니다. 덩치가 큰 야생동물이 아니더라도 새, 쥐, 개구리, 벌레 등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많은 생명을 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북미에서 21개월 지내면서, 장거리 로드트립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로드킬을 보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슴과 코요테, 다람쥐, 새 등의 동물들을 차로 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사슴의 경우에는 마을 진입로에 대문짝만한 전광판으로 사슴주의 경고와 로드킬로 죽은 사슴 수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저녁에 도로 위에 사슴이 서있으니 분간이 어려웠습니다만 다행히 그 도로 위에 있던 모든 차량이 저속이었기에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꺼 주며 사슴이 지나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야생동물 유도펜스와 생태통로, 야생동물 출현주의 표지판 외에는 별다른 노력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크건 작건 모두 다 같은 생명이라는 의식과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속도 줄이기 등의 작은 실천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녹색연합에 가입한 뒤 로드킬 실태와 경감 대책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던 중 마침 <어느날 그 길에서> 상영회 및 토론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드킬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여 <어느날 그 길에서>를 보고 토론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날 그 길에서>는 한국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이 야생동물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를 덤덤하게 조명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최태영, 최천권, 최동기님의 로드킬 조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되었고 그 후로 생태통로가 개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도로는 지속적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단절하여 새로 생긴 도로에서 일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야생동물들은 또 다시 도로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항상 긴장합니다.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갈라놓은 그것도 새로 생긴 도로에서는 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끝내고 나면 녹초가 되어버리고 그러다보면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가시기도 합니다. 가끔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탐사를 가다가 죽어있는 로드킬을 발견하면서 괴리감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에는 열광하면서 죽어버린, 그것도 엉망이 되어버린, 도로 위의 먼지가 되어버린 야생동물에게는 관심이 없을까요? 그들도 차에 치기 전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살 수 있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게 우리 삶의 속도를 조금만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무심코 벌어진 로드킬로 동물이 멸종되었다는 기사가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나올지도 모르는 이 속도 지상주의 초고속사회의 가속기에서 발을 조금만 떼어보면 어떨까요.
글: 긴수염
*긴수염 님은 야생동물 소모임 회원이자 소모임 안밖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녹색연합 신입회원이다.
정리: 김수지(녹색연합 회원더하기팀)